[도서]기자, 문화를 추천하다 「런던통신1931-1935」
[도서]기자, 문화를 추천하다 「런던통신1931-1935」
by 박혜림 객원기자 2016.02.24
젊은 지성을 깨우는 짧은 지혜의 편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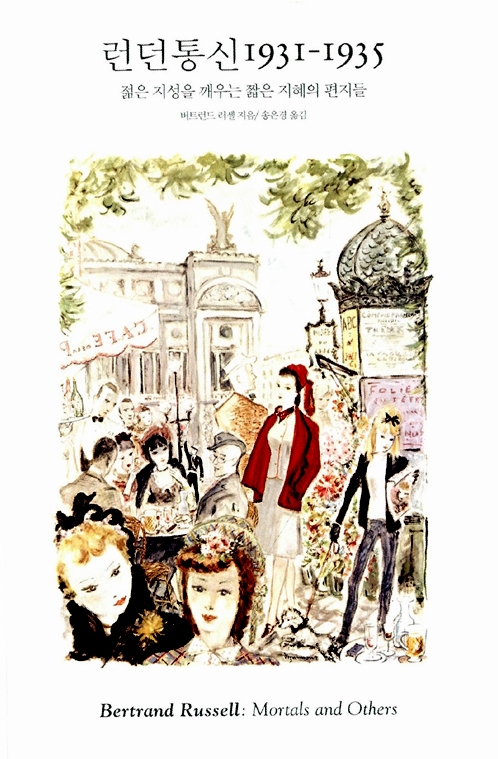
필자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 철학자라는 이들은 존경스러우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수학을 한다는 이들은 경이롭기까지 하고 그 학문엔 접근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인정받은 이가 있으니 바로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이다. (러셀은 1950년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수학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 혹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작가가 수학도 잘하다니, 그의 균형 잡힌 좌뇌와 우뇌의 발달이 부러울 따름이다.)
오늘 소개하는 러셀의 (이하 )는 러셀이 1931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의 신문에 연재했던 에세이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출판사의 홍보 문구이기는 하나 실제로 러셀을 처음 접하는 이라면 이 책을 입문 과정으로 삼으라는 의견에 필자도 동의한다. 먼저 신문에 연재됐던 글들이기 때문에 한 에세이당 길이가 짤막해 읽기에 매우 편안하다. 각 글에서는 러셀의 박학다식함과 논리적인 글 솜씨를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이 특유의 장난기로 버무려져 있어 읽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다. 무엇보다 그 옛날에 쓰인 주제들이 마치 요즘 신문의 그것들인 듯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학창 시절에 회초리나 채찍으로 매를 맞았던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 덕에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체벌이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이다. 어른이 되어서든 어렸을 때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된다...-체벌의 악영향 中->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85년 전 러셀의 대답이다.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도 태형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체벌에 대한 러셀의 견해는 놀랍다.
<...이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에 비하면 하루살이처럼 덧없는 존경을 추구한다. 인간의 작품은 점점 위엄을 잃어 가는데, 그런 작품으로 잡다한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는 노력만 많아졌다. -당신은 누구의 존경을 원하는가?中->
1931년도에 쓰인 글이지만 어떤가? “좋아요” 하나에 목숨을 거는 요즘의 SNS세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쌍문동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응답하라 1988이 큰 인기를 얻으며 80년대에 대한 향수로 그 시절의 것들이 다시 크게 유행했다. ‘왜 그 때의 따뜻한 감성이 지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신문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80년대가 좋기만 한 시대였는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히려 암흑 같은 시대가 아니었나? 왜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상을 갖게 되는가? 러셀은 ‘옛날이 좋았지’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쟁과 불황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세상은 점점 더 인간다워지고 평균적인 인류의 행복도 증가하고 있다. 좋았던 그 때 그 시절에는 행복했으리라는 생각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믿음으로, 절실히 필요한 개선을 반대하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과거를 너무 좋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현재를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
몇 년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사회 소외층을 대변한다는 진보가 외제차에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진보는 간지나는 진보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냐?”라고 했을 때 필자는 ‘그게 왜 웃기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명쾌하게 반박할 말을 생각해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1932년의 러셀이 그 답을 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사회주의자가 좋은 시가를 피운다면’ 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 줄 한 줄 밑줄 긋고 싶은 명언들로 가득한 이 책을 읽으며 필자가 최고로 꼽은 구절로 글을 마무리한다.
오늘 소개하는 러셀의 (이하 )는 러셀이 1931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의 신문에 연재했던 에세이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출판사의 홍보 문구이기는 하나 실제로 러셀을 처음 접하는 이라면 이 책을 입문 과정으로 삼으라는 의견에 필자도 동의한다. 먼저 신문에 연재됐던 글들이기 때문에 한 에세이당 길이가 짤막해 읽기에 매우 편안하다. 각 글에서는 러셀의 박학다식함과 논리적인 글 솜씨를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이 특유의 장난기로 버무려져 있어 읽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다. 무엇보다 그 옛날에 쓰인 주제들이 마치 요즘 신문의 그것들인 듯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학창 시절에 회초리나 채찍으로 매를 맞았던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 덕에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체벌이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이다. 어른이 되어서든 어렸을 때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된다...-체벌의 악영향 中->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85년 전 러셀의 대답이다.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도 태형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체벌에 대한 러셀의 견해는 놀랍다.
<...이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에 비하면 하루살이처럼 덧없는 존경을 추구한다. 인간의 작품은 점점 위엄을 잃어 가는데, 그런 작품으로 잡다한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는 노력만 많아졌다. -당신은 누구의 존경을 원하는가?中->
1931년도에 쓰인 글이지만 어떤가? “좋아요” 하나에 목숨을 거는 요즘의 SNS세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쌍문동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응답하라 1988이 큰 인기를 얻으며 80년대에 대한 향수로 그 시절의 것들이 다시 크게 유행했다. ‘왜 그 때의 따뜻한 감성이 지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신문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80년대가 좋기만 한 시대였는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히려 암흑 같은 시대가 아니었나? 왜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상을 갖게 되는가? 러셀은 ‘옛날이 좋았지’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쟁과 불황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세상은 점점 더 인간다워지고 평균적인 인류의 행복도 증가하고 있다. 좋았던 그 때 그 시절에는 행복했으리라는 생각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믿음으로, 절실히 필요한 개선을 반대하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과거를 너무 좋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현재를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
몇 년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사회 소외층을 대변한다는 진보가 외제차에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진보는 간지나는 진보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냐?”라고 했을 때 필자는 ‘그게 왜 웃기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명쾌하게 반박할 말을 생각해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1932년의 러셀이 그 답을 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사회주의자가 좋은 시가를 피운다면’ 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 줄 한 줄 밑줄 긋고 싶은 명언들로 가득한 이 책을 읽으며 필자가 최고로 꼽은 구절로 글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