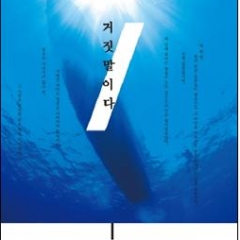[영화]기자, 문화를 추천하다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영화]기자, 문화를 추천하다 『스포트라이트(Spotlight)』
by 박혜림 객원기자 2016.08.31
“그게 당신이었을 수도 있었고, 나일 수도 있었고, 우리 중 누구일 수도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경찰관을 낮춰 부르는 ‘짭새’라는 단어만큼이나 일반적이 된 또 다른 직업군 비하 단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가 그것이다. ‘짭새’의 어원이 분분한 반면 ‘기레기’는 신조어인 만큼 그 뜻이 분명하다. 왜 기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됐는지는 인터넷 뉴스 몇 개만 읽어봐도 납득이 될 것이다. 자극적인 기사제목은 너무 일반적이라 더 이상 자극적이지도 않다. 몇 개의 단어와 문장 구조는 다르지만 방금 읽은 듯한 기사에 –단독보도-가 붙는다. 단순한 기사의 질뿐만이 아니다. 연예계 관련 큰 스캔들이 터지면 독자들의 반응이 이젠 한결같다. “또 무슨 일을 덮으려고 이런 걸 터뜨리는 거야?”.
왜 뉴스를 뉴스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까? 왜 ‘언론고시’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언론사의 시험을 통과하여 어려운 수습 과정을 거쳐 기자가 된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게 보통인 사회 분위기가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는 실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보도 행태를 돌아보며 언급되는 작품이다.
2002년 미국 보스턴,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기사가 있었다. 이것은 실화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도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교회의 실체를 파헤치는 기자들의 행보가 영화의 전부다. 러브라인, 자극적인 성적 장면, 그 무엇도 없다.
보스턴 글로브지에 새로 부임한 편집국장 마티(리브 슈라이버 분)가 팀 기자들에게 ‘진짜 기사’를 요구하며 영화는 시작된다. 그들이 쓰려는 기사는 쉽지 않다. 미국 내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조하려는 이도, 기관도 없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졌다.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기록이, 사건 자체가 사라졌다.
필사적으로 시간을 쫓는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묻는다. “그런 걸 보도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사건을 쫓던 중 보스턴 글로브지 기자들은 스스로 잊고 있었던 사건을 만나게 된다. 이미 몇 년 전 같은 사건에 대한 제보가 보스턴 글로브지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자신들의 취재에 협조하지 않는 증인과 변호사들이 이야기한다. “왜 이제 와서야 이러는 거죠?”.
엄청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며 자신들이 과거에 있었던 제보들을 무심하게 넘겼던 일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는 기자들에게 편집국장 마티가 말한다. “가끔 쉽게 잊지만 우린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살아가요, 갑자기 불을 켜면 탓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우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영화는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언론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 놓는다. 누군가의 이익이나 집단의식과는 상관없는 진실에 대한 보도,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 진실을 쫓는 서로에 대한 격려.
모든 것을 장악한 것과의 싸움을 벌이는 이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영화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향, 촬영기법 등에서 모든 개입이 최소화된 느낌의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발생하는 몰입도는 엄청나다. 그것이 ‘진실’의 힘일 것이다. 실제 팀은 이 취재로 2002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학대하는 것도 마을 전체의 책임이에요.”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다. 언론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중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클까.
언론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이들도 언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이니 이 영화를 통해 독자로써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가 그것이다. ‘짭새’의 어원이 분분한 반면 ‘기레기’는 신조어인 만큼 그 뜻이 분명하다. 왜 기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됐는지는 인터넷 뉴스 몇 개만 읽어봐도 납득이 될 것이다. 자극적인 기사제목은 너무 일반적이라 더 이상 자극적이지도 않다. 몇 개의 단어와 문장 구조는 다르지만 방금 읽은 듯한 기사에 –단독보도-가 붙는다. 단순한 기사의 질뿐만이 아니다. 연예계 관련 큰 스캔들이 터지면 독자들의 반응이 이젠 한결같다. “또 무슨 일을 덮으려고 이런 걸 터뜨리는 거야?”.
왜 뉴스를 뉴스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까? 왜 ‘언론고시’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언론사의 시험을 통과하여 어려운 수습 과정을 거쳐 기자가 된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게 보통인 사회 분위기가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는 실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보도 행태를 돌아보며 언급되는 작품이다.
2002년 미국 보스턴,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기사가 있었다. 이것은 실화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도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교회의 실체를 파헤치는 기자들의 행보가 영화의 전부다. 러브라인, 자극적인 성적 장면, 그 무엇도 없다.
보스턴 글로브지에 새로 부임한 편집국장 마티(리브 슈라이버 분)가 팀 기자들에게 ‘진짜 기사’를 요구하며 영화는 시작된다. 그들이 쓰려는 기사는 쉽지 않다. 미국 내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조하려는 이도, 기관도 없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졌다.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기록이, 사건 자체가 사라졌다.
필사적으로 시간을 쫓는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묻는다. “그런 걸 보도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사건을 쫓던 중 보스턴 글로브지 기자들은 스스로 잊고 있었던 사건을 만나게 된다. 이미 몇 년 전 같은 사건에 대한 제보가 보스턴 글로브지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자신들의 취재에 협조하지 않는 증인과 변호사들이 이야기한다. “왜 이제 와서야 이러는 거죠?”.
엄청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며 자신들이 과거에 있었던 제보들을 무심하게 넘겼던 일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는 기자들에게 편집국장 마티가 말한다. “가끔 쉽게 잊지만 우린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살아가요, 갑자기 불을 켜면 탓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우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영화는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언론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 놓는다. 누군가의 이익이나 집단의식과는 상관없는 진실에 대한 보도,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 진실을 쫓는 서로에 대한 격려.
모든 것을 장악한 것과의 싸움을 벌이는 이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영화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향, 촬영기법 등에서 모든 개입이 최소화된 느낌의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발생하는 몰입도는 엄청나다. 그것이 ‘진실’의 힘일 것이다. 실제 팀은 이 취재로 2002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학대하는 것도 마을 전체의 책임이에요.”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다. 언론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중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클까.
언론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이들도 언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시대이니 이 영화를 통해 독자로써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